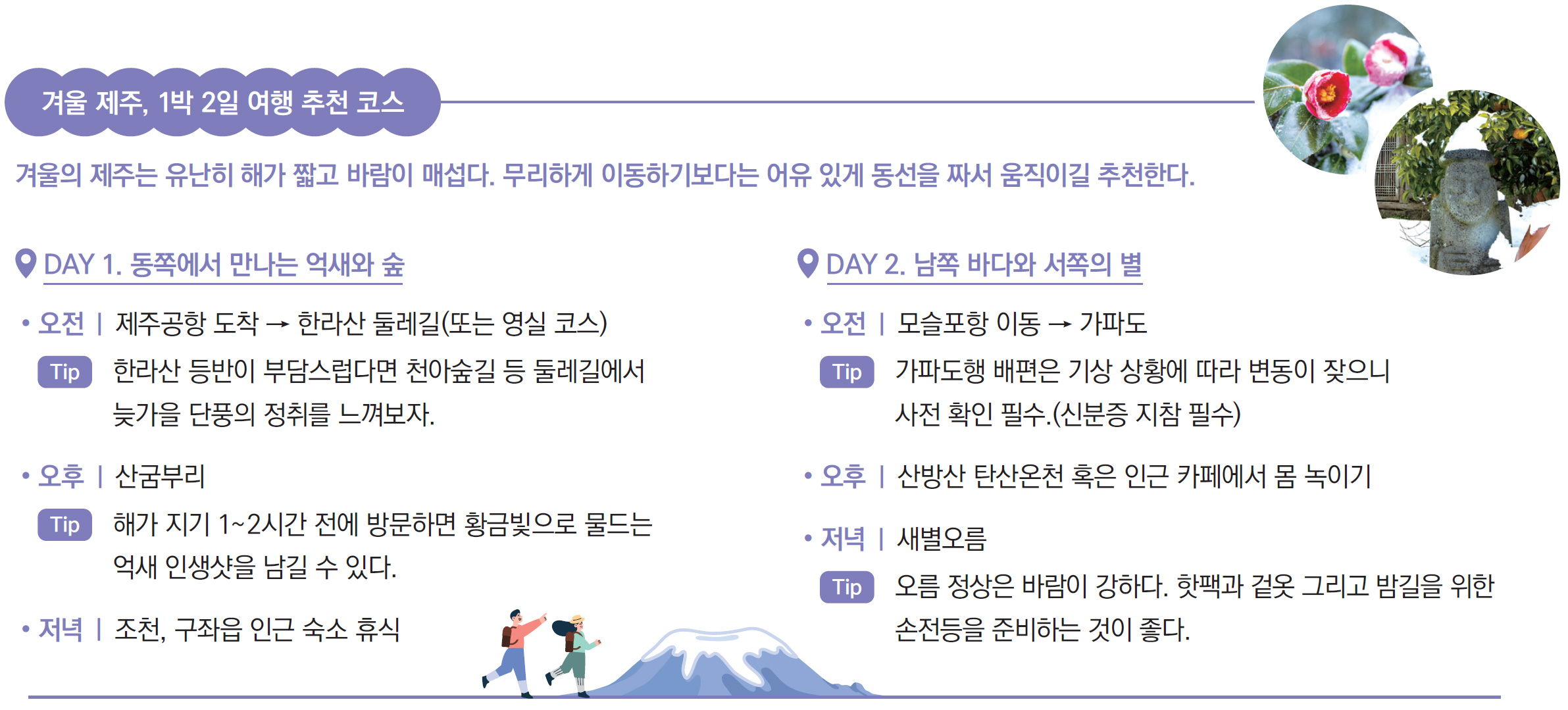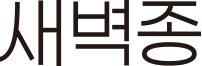쉼표 여행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겨울 제주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다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사람들은 흔히 따뜻한 남쪽 나라를 꿈꾼다.
하지만 11월과 12월의 제주도는 마냥 따뜻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육지보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는 더 높게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겨울의 제주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화려한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채워진 ‘여백’과 ‘침묵’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다.
여름의 제주가 에메랄드빛 바다와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면, 겨울의 제주는 차분한 사색의 공간이다.
오름의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 소리,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한라산의 웅장함,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속삭임까지.
1년 중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겨울 제주로 쉼표 여행을 떠나보자.
글. 김성희
제주의 가을과 겨울 사이, 가장 극적인 풍경을 꼽으라면 단연 산굼부리다. 해발 400m 고지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인 오름과 달리 용암이 분출하지 않고 폭발만 일어나 구멍이 뻥 뚫린 ‘마르(Maar)’형 분화구다. 하지만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지질학적 가치보다 눈 앞에 펼쳐진 광활한 억새밭이다.
겨울의 산굼부리는 말 그대로 ‘은빛 바다’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억새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일제히 몸을 눕히며 ‘쏴아아’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와 닮았으면서도 더 건조하고 서걱거린다. 햇살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억새는 은색이었다가, 금색이 되기도 하고, 해 질 녘에는 붉은빛을 머금은 갈색으로 변모한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의 능선과 제주의 동쪽 오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억새밭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 생각들도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듯하다. 잎을 다 떨군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듯, 우리 마음의 군더더기를 털어내기에 이만한 장소는 없다.
서부 중산간 오름 지대 중에서 으뜸가는 경관을 자랑하는 새별오름. ‘초저녁에 외롭게 떠 있는 샛별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이곳은 해가 지고 난 뒤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물론 가파른 경사를 올라 마주하는 낮의 풍경도 근사하지만, 겨울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간은 해 질 녘부터 밤까지다.
새별오름으로 향하는 길, 억새가 춤추는 들판 너머로 붉은 노을이지면 세상은 잠시 숨을 죽인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켜진다. 겨울철 제주의 대기는 차갑고 건조해서 별을 관측하기에 더없이 좋다.
정상에 서서 고개를 들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이야기가 밤하늘에 흐른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우주의 신비로움 앞에서는 인간의 고민이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가. 새별오름의 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선물한다.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남짓, 가파도는 한국에서 가장 키 작은 섬이다. 섬의 최고 높이가 해발 20m에 불과해, 섬 어디에 서더라도 수평선이 눈높이에 머문다. 봄날의 가파도가 초록색 청보리 물결로 생동감이 넘친다면, 겨울의 가파도는 모든 것을 비워낸 ‘무(無)’의 미학을 보여준다.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겨울 가파도는 적막하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싫지 않다.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겨울 가파도에서는 페달을 밟는 속도조차 늦춰야 할 것 같다. 낮게 깔린 지붕들, 돌담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그리고 거친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전부다.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풍경은 특별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웅장하게 솟아있는 한라산과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산방산, 송악산의 실루엣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곳. 가파도는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11월과 12월의 한라산은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아직 떠나지 못한 늦가을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겨울의 냉기가 나뭇가지를 하얗게 얼린다.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영실 코스나 어리목 코스를 추천한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아래에는 낙엽이 푹신하게 깔려 있고 머리 위로는 앙상한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린다.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졸참나무들이 마지막 빛깔을 뽐내고, 그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서리꽃(상고대)은 보석처럼 반짝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쯤 마주하는 탁 트인 전망은 산행의 고단함을 단번에 씻어준다. 발아래 구름이 바다처럼 깔린 운해(雲海) 위로 솟아오른 윗세오름의 풍광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땀 식은 몸에 들이키는 차가운 공기 한 모금은 그 어떤 보약보다 달다. 한라산의 겨울은 걷는 자에게만 허락된 숭고한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