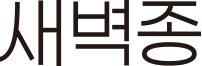그 노래,
그 길
글. 편집실
바다와 삶이 만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춤
강원 동해시
계절이 깊어질수록 여행은 속도를 잃는다. 더 멀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쪽을 택하게 된다. 겨울의 동해는 그런 선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화려함보다 고요가 먼저 다가오고, 풍경은 말을 아끼며 제 자리를 지킨다.
가장 먼저 하루를 맞이하는 ‘추암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은 동해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새벽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수평선 위로 빛이 번지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가 이루는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이른 아침의 추암해변은 특히 고요하다. 관광객의 발길이 본격적으로 닿기 전 모래사장을 걷다보면 파도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빠르게 흘러가던 생각은 잦아들고, 마음은 파도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가라앉는다. 추암해수욕장은 그래서 ‘보는 곳’이기보다는 ‘머무는 곳’에 가깝다.
추암해수욕장 하면 ‘촛대바위’ 역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오랜 시간 파도에 깎이고 바람에 닳으며 만들어진 촛대바위의 형상은 태고에 땅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침식의 결과물이다. 바위 위로 부딪히는 파도는 거칠지만 규칙적이고, 그 반복 속에서 바위는 조금씩 모양을 바꿔왔다.
계절에 따라 이곳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진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활기가 더해지지만, 겨울의 바다는 차가운 공기와 은은한 햇살 속에서 더 짙은 빛깔을 띠고, 바위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사람의 움직임이 줄어든 자리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 풍경 앞에 서면,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추암해수욕장은 동해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자 여행자의 마음에 첫 쉼표를 찍어주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아도 좋다. 다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혹은 파도의 리듬이 몸에 스며들 때까지 잠시 멈춰 서 있기만 해도 이 바다는 충분히 제 몫의 이야기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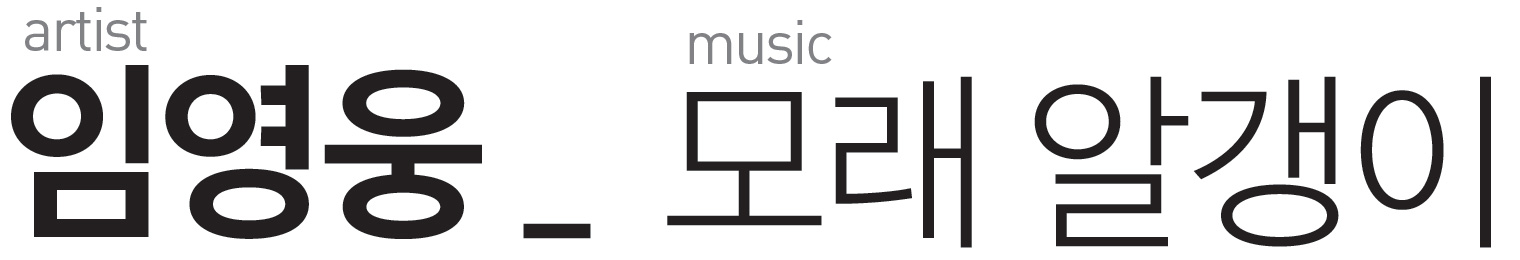
작은 감정과 순간을 차분히 쌓아가는 이 노래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여는 추암해변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강한 기승전결 대신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선율은 파도의 리듬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한층 느리게 만든다.
하루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묵호항’
묵호항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항구로 현재까지도 어업과 생활 기능이 함께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부두와 선착장, 어선이 정박하는 공간이 이어지고, 그 뒤로는 상가와 주거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 항구와 도시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곳은 동해시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그래서인지
묵호항은 언제 찾아도 ‘동해시 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른 새벽부터 배가 드나들고, 낮에는 사람과 물건이 오가며, 해질녁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이른 아침의 묵호항은 하루 중 조용하면서도 꽤 분주한 모습이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정해진 역할에 따라 바쁘게 움직인다.
낮이 되면 항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어시장과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항구는 어부들의 일터에서 수산물을 사고파는 시장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홀연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홀연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임영웅, 〈모래 알갱이〉 중에서
해가 질 무렵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작업이 마무리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도 보이기 시작한다. 묵호항은 이렇게 늘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끝내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을 맞는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적어 묵호항의 모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성수기에 가득 공간을 채우던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항만 시설과 작업장, 인접한 바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볼거리’보다는 ‘묵호항’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다.
묵호항은 동해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동해라는 도시가 바다를 관광 자원 이전에 생활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과장 없이 기능으로 설명되는 항구, 그것이 묵호항의 성격이다.
삶의 역사가 만들어 낸 ‘논골담길’
묵호항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이내 동해의 바다와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논골담길이 눈을 사로잡는다. 화려한 모습의 관광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이 오랜시간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 아니라, 한 도시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골목은 좁게 굽이진다. 집과 집 사이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지만 때로는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담벼락 곳곳에는 벽화와 안내 문구가 더해져 있지만 이 길의 주인공은 분명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빨래가 널린 창가, 오래된 우편함, 닳아 있는 계단 손잡이 같은 사소한 풍경이 이곳이 ‘살아 있는 동네’임을 증명한다.
논골담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골목과 집이 보이던 풍경이 어느 순간 바다와 항구로 확장된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동해의 모습은 생활의 현장 그대로의 풍경이다. 항구에 정박한 배,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논골담길의 길의 진짜 매력은 천천히 걸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빠르게 오르면 금세 끝나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논골담길은 풍경만 놓고 보면 조용한 산동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탄광과 항구가 함께 움직이던 시절 일터와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지금은 탄광 산업이 쇠퇴하고 항구의 역할이 변하면서 이 동네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벽화와 안내 표지, 전망 공간이 더해졌지만 골목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위아래로 이어진다. 그 덕분에 논골담길에는 과거의 생활 방식이 비교적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동해시는 특별한 장면을 앞세우기보다 이미 자리 잡은 풍경을 그대로 두는 도시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고, 항구는 제 역할을 이어가며, 골목은 오래된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 있다.